인생의 환경에 대하여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우리의 앞날이 정해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익히 들어 알고 있고 인간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또 반대로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그러한 환경 중 하나가 출생에 의하여 얻어지는 지위나 생활환경이고 이것을 나타내는 것 중 하나가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성(family name)과 이름(Name)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성(family name)은 그 사람의 내역이나 출신성분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테일러, 스미스라는 직업을 나타내는 성이며 또 재미있는 것도 많은데 한 예로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Einstein)은 놀랍게도 돌 하나라는 뜻으로 어느 현명한 유대계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에 버금간다는 뜻으로 쯔바이슈타인(Zweistein)으로 즉 돌 두 개라고 불러 자식의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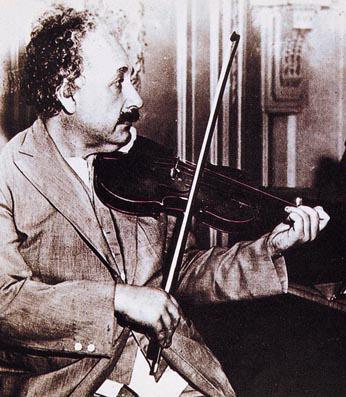
그러나 오래 전부터 성이 존재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유목민족의 경우에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아도 성씨의 흔적은 그리 많지 않고 또 우리와 같은 유목민족인 유대인의 역사라 할 수 있는 성경을 보아도 그들은 다윗의 자손 아무개 등의 표현을 했으며 2차 대전 당시 독일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성을 매매했다는 것을 보면 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성은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예로써 서양에서 성 앞에 붙이는 호칭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써(Sir), 독일은 폰(Von), 네덜란드는 반(Van)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루드비히 반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의 예를 들자면 베토벤은 독일이 통일되기 전인 근년까지 서독의 행정수도였던 본에서 출생한 독일사람 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베토벤이라는 성 앞에 붙어있는 반이라는 호칭을 보면 네덜란드의 귀족호칭으로 베토벤의 가족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네덜란드로부터 이주해 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으로 귀족이라면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와 같이 폰(Von)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야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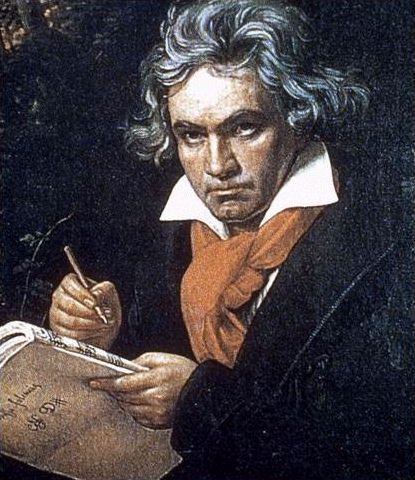
헝가리의 저명한 미학자이자, 문예이론가인 게오르그 루카치(Georg Lukacs)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헝가리계 유대인으로 그의 이름은 게오르그 폰 루카치(Georg von Lukacs)라는 독일의 귀족을 상징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에 귀속된 영지였음을 상기할 때 유대인으로 독일의 귀족칭호는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루카치 자신도 젊은 날을 베를린 등지에서 유학하였으므로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초기 작품에는 게오르그 폰 루카치(Georg von Lukacs)라라는 저자명이 붙어있으나 1918년 루카치는 헝가리 공산당에 입당하고 공산주의자로 전향한 다음 그의 아버지가 어렵게 얻고, 그가 한때는 자랑스럽게 여겼을지도 모를 폰(von)이라는 칭호가 이제는 필요 없고 아니 오히려 짐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1920년대를 전후로 그의 작품의 저자 명에 폰 이라는 호칭은 없어지고 게오르그 루카치라는 이름만 남게 되는데 특히 1920년부터 정치활동을 하면서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하여 1923년에 저술된 그의 대표작인 "역사와 계급의식"에는 귀족칭호인 폰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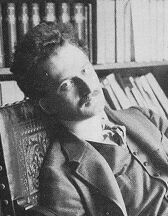
아인슈타인의 예에서 보듯이 그의 성이 돌(Einstein)이라도 우리는 그의 상대성이론과 물리학적 업적을 찬양하며 독일어를 모르는 대다수는 그의 이름이 돌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베토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출생에서 오는 주변의 환경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반(van)이라는 그의 성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네덜란드의 혈통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가 귀족출신이었는지 보다는 작품성과 더욱이 그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훌륭한 음악을 작곡했다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한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루카치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루카치가 높은 귀족의 지위를 나타내는 폰(von)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사회주의자가 된 이후에는 그 호칭조차도 그에게는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대에는 물질중심의 서구문명이 대두되어 사람들은 곧잘 물질적인 환경이나 태생에 대하여 불만을 터뜨리곤 하는데 역사의 연구의 저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에서 문명은 어려운 환경에서 꽃을 피우고 좋은 환경에서는 시들기 쉬움을 도전과 응전이라는 표현으로 역설했고, 아인슈타인, 베토벤이나, 루카치의 예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외적인 표현에 신경을 쓰는 것은 단지 혼자만의 생각일 뿐 그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나 장애가 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이 남긴 업적, 발자취 즉 교향곡이나 '역사와 계급의식'이라는 증거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따라서 남이 염두에 두지 않고 곧 없어지거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조금 더 오래 남고 나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으며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에 노력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에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가 속한 환경에 예속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 즉 Blue Ocean을 개척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 벤저민 디즈레일리
“가난한 집안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으며 몸이 약했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정규학업을 못했던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 선생이어서 모르면 묻고 배웠습니다.” - 마쓰시다 곤노스케( 松下幸之助)